월요일을 앞둔 고요한 밤이었다. 잠들기 전 아내와 몽고반점을 읽었다. 학창시절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돌려 보듯이, 내가 한 시간 반, 아내가 한 시간, 그렇지만 영화 한 편을 같이 보듯이, 그렇게 봤다. 그 시간 동안에는 책이 나를 삼겼다. 초록 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는 둥실 잠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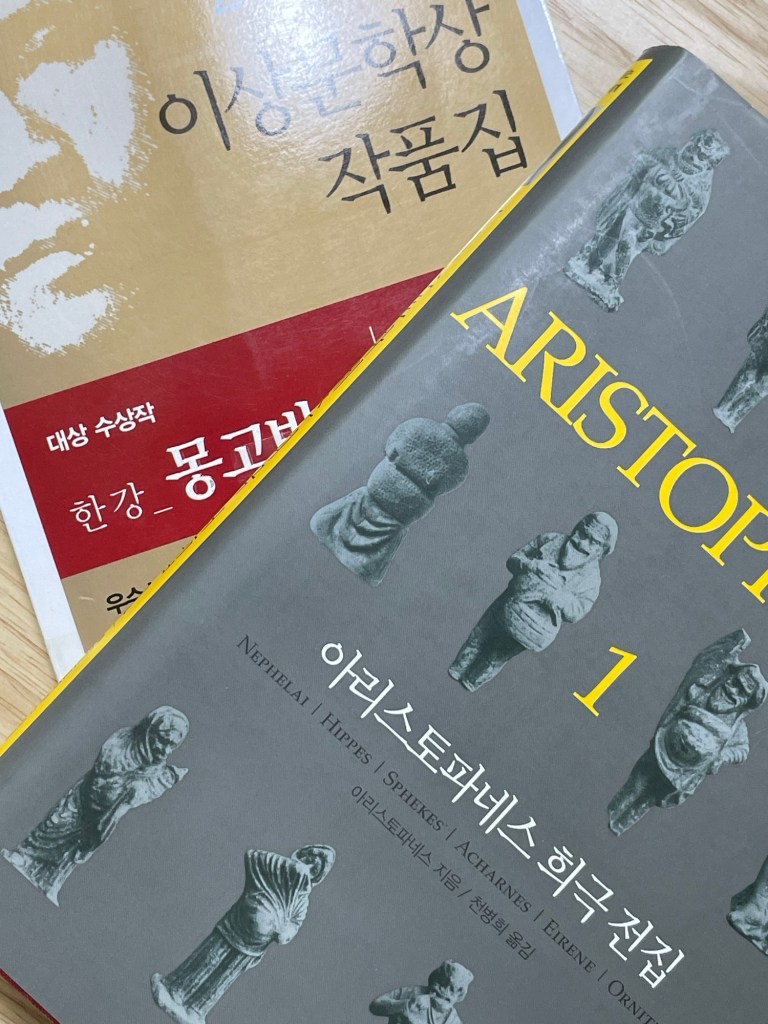
출근 전에는 아내와 몽고반점 이야기를 했다. 나는 일상성-본래성이라는 틀로 처제와 ‘나’, J와 P, 아내와 동서 등등…을 풀어 보려고 했다. 머리는 까치집에 샐러드를 꿴 포크를 든 채 엉덩이를 들썩이며 말했다. 아내가 웃었다. 그때 문득 생각했다. 책 읽고 이렇게 흥분했던 게 언제였지?
환절기 출근길에는 묵은 옷장 냄새가 난다. 이건 각자의 집 냄새다. 낯설면서 익숙한 냄새, 자취를 시작하고 부모님 집에 오랜만에 갈 때 느껴지는 냄새다. 책읽기에도 냄새가 있다면 몽고반점에서 이런 냄새가 났다. 수업시간에 몰래 읽은 소설 냄새,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에서 뽀르뚜가 아저씨가 죽을 때 제제랑 같이 오열하던 냄새.
그동안 나는 행군하는 군인처럼 책을 읽어 나갔다. 즐겁기도 했으나 그 마음은 일종의 정복감이었지,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참전용사의 마음은 결코 아니었다.
오랜만에 찾아간 집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