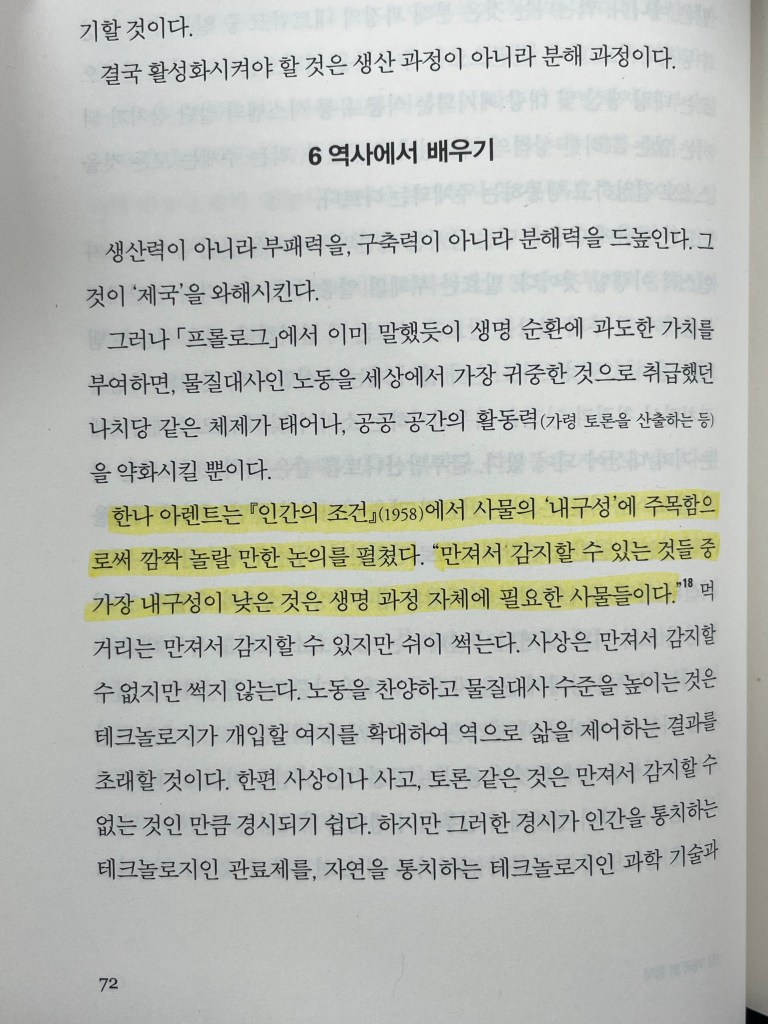아렌트를 공부하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 아렌트가 마르크스를 비판하면서 사물의 내구성에 주목했다는 점.
-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생각보다 우리 학계가 사물의 내구성보다 정치 행위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다는 점.
후지하라 다쓰시의
-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자본과 노동을 구분해 생각할 수 있다. 노동은 소비재를 소모한 결과이고, 자본은 사용대상을 축적한 결과니까. 소비재는 쌓아봐야 상해서 축적이 안 된다. 아끼면 똥 된다.
- 행위는 사물을 경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적이지만, 내구성을 갖춘 사물을 경유해서만 기억된다는 점에서 인간적인 일이다. 동시대인에게는 신적이지만 후손이 태어나면 인간적인 활동이 된달까? 기억의 조건은 작업이다. 노동의 산물은 기억되지 않는다.
아렌트는 왜
- 내구성은 사물을 신격화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아렌트가 대학시절 연구했던 학자는 아우구스티누스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생장쇠멸을 존재의 양태이자 한도(modus)라 했다. 이 한도에서 벗어난 존재는 신뿐이다. 신은 부패되지(corruptus)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쇠멸하지 않고 끊임없이 축적되는 자본은 마치 신처럼 존재의 한도를 거스른다. 물신(fetish)이다.
- 근대 사회는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세계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박사논문에서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과 에피쿠로스의 원자론을 구분한다. 전자는 분해될 수 없는 원리(ἄτομοι ἀρχαί)이고, 후자는 복합체를 구성하는 요소(ἄτομα στοιχεῖα)이다. 요소로서의 원자는 운동의 기초가 된다. 구성과 분해를 반복하는, 무엇도 고정된 것 없는 세계가 열린 것이다. 무한한 운동과 노동하는 동물(animal laborans)의 승리를 근대의 특징으로 둔 이유이다.
아직
또 재밌는 포인트는 흙과 인간의 관계다. 흙은 모든 것을 분해하는 공간이자 여러 분해자가 모여사는 복합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모를 연속체이기도 하고. 잠바티스타 비코가 인간성(humanitas)의 어원으로 흙(humus)을 제안한 이유일 것이다.
내일 저녁에 저자를 만나는데, 설렌다.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까? 나는 무엇을 물어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