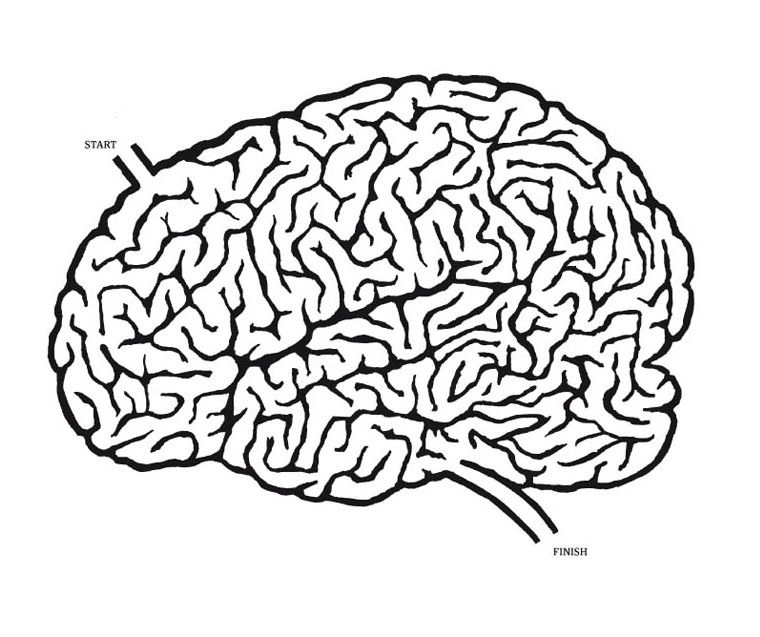행복: 내 안의 영혼 닦기
이 글은 “서양고대철학1(강철웅, 박희영, 이정호, 전헌상 외 저, 도서출판 길)”을 읽고 제 나름대로 요약 및 해석한 글입니다.
플라톤을 살피기에 앞서
이 책은 플라톤을 설명하기 전까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각각의 장에 독자적인 학파와 학자를 배치했다. 그러나 플라톤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장을 배치하는 방식 변화했다. 윤리학 → 영혼론 → 인식론 → 형이상학 → 정치철학 → 예술철학으로 이어지는 방식이, 나는 궁금했다. 플라톤 이후에 형성된 철학의 근원적인 분과가 총 여섯 개인 것인가? 아니면, 플라톤의 사상이 시간상 위와 같은 흐름으로 전개된 것인가? 이 책은 이 물음에 대해 어디에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나는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이 나름의 해답을 찾았다. 플라톤의 철학을 아우르는 것은 윤리학이므로 윤리학이 가장 처음에 등장해야 한다. 나아가 플라톤의 철학은 세 부분으로 형성되는데, 개별적인 인간에 대한 논의(윤리학, 영혼론), 인간과 세계에 대한 논의(인식론, 형이상학), 인간과 다른 인간에 대한 논의(정치철학, 예술철학)가 그 부분이다. 따라서 나는 플라톤을 분석하는 여섯 개의 글을 세 개씩 묶어 두 편으로 쓰고자 한다.

제10장 플라톤의 윤리학
플라톤의 저작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대화의 방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저작이 함유하고 있는 사상의 주인에 대해 논의의 소지가 있다. 플라톤의 저작을 소크라테스에 대한 역사적 기록으로 볼 것인가, 또는 플라톤 자신의 철학으로 볼 것인가? 갑론을박이 있지만 이 책은 플라톤의 사상으로 잠정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윤리학은 좋은 삶에 대한 탐구이다. 인간은 행복(eudaimonia)한 삶과 잘 행위하는(eu prattein) 삶을 그 자체 목적으로 추구한다. 플라톤에게 행복은 덕(또는 탁월성, arete)을 갖춘 삶이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지혜(phronesis)와 진리(aletheia), 영혼(psyche)이 뛰어난 상태에 있게 되도록 마음을 쓰는 일”(이 책 316쪽, <변론> 29e)이 덕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한다. 덕을 얻은 사람은 실천적 지혜(phronesis)를 얻은 사람, 즉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옳게 행위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앎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적인 판단에 따른 선택으로 삶을 살도록 하고, 자신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보편적인 맥락을 알도록 하며, 삶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을 제공해 책임감 있게 살도록 한다.
인간이 삶에서 만나는 윤리적 문제는 선택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문제로 환원된다. 플라톤의 윤리학은 인식과 실천의 문제를 분리하지 않는다. 쾌락이나 감정에 밀려 합리적으로 행위하지 못하는 현상이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지주의적 주장은 현실적인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는 자제력 없음(akrasia), 즉 아는 것과 행한 것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다만, 현대의 윤리학은 개별적인 행위를 중심에 두고 논의를 전개하는 반면, 플라톤의 윤리학은 철학적 사유를 통해 덕을 추구하여 영혼을 정화하는 행위자를 중심에 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실천 장면에서 플라톤의 윤리학은 한 가지 해명이 필요하다. 지혜, 절제, 용기, 정의, 경건 같은 개별적인 덕행이 앞서 제시한 앎으로서의 덕과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대한 해명이다. 플라톤은 다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다섯 행위가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그러한 행위를 이끌어내는 영혼의 경향성’을 지칭한다고 주장한다. 덕의 단일성(the unity of virtue)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실천적 지혜와 행위를 인과적으로 연결한다.
플라톤은 정의(또는 올바름, 올바른 상태, dikaiosyne)를 조화로운 상태로 정의하며, 그 결과와 그 자체 모두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플라톤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정치 공동체와 인간의 유비적 연관성에 바탕한다. 플라톤은 나라의 기원(arche)를 필요(chreia)로 제시한다(<정체> 369b). 자족적이지 못한 인간이 서로 협력해 생활 공동체(synoikia)가 나라(polis)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시민, 즉 공동체 속의 인간은 일(ergon)을 하는데, 더 많이, 더 훌륭하게 그 일을 하기 위해 본성(physis)에 따라 일을 분담하여 조화를 이룬다. 정치는 모든 시민이 최대한의 덕을 체득하고 발휘하여 행복을 누리는 데 궁극적인 지향점을 둔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 역시 여러 부분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올바른) 상태가 된다. 나아가, 플라톤은 사람의 법이나 관습(nomos)이 자연(또는 본성, physis)에 근거할 때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의 기준만을 따르는 경우 소피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주의의 무한소급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에게 덕은 교육과 연습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이다. 이상적인 국가를 위해서는 철학자들이 수호자 계급에 임명되어야 한다고 주장(<정체> 375e)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플라톤은 이상 국가의 교육 과정에 마지막에 좋음의 이데아와 변증술(dialektike)을 포함한다. 인간은 변증술을 통해 묻고 대답하는 행위에서 확고한 원리(arche)를 깨닫기 때문에 변증술은 덕을 체득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변증술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철학적 대화를 통해 그들의 영혼과 좋음의 이데아가 직접 연결된다. 플라톤에게 덕은 철학적 탐구를 통해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며, 행복은 도달한 어떤 상태이기보다 철학적 탐구를 통해 갈고닦은 판단력에 따라 행위하는 삶이다.
>> 그렇다면 현대의 윤리학은 왜 행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게 되었을까? 철학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개별적인 현상에서 보편적인 설명을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할 때, 공리주의나 의무론과 같이 개별적인 행위에서 일반론을 구성하는 논의가 더욱 진보된 철학이 아닐까? 그런데 현대의 윤리학은 정말 진보된 철학일까?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적 일반화가 지닌 폭력성에 반대한 바 있다. 플라톤 윤리학의 방식은 근대적 폭력성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제11장 플라톤의 영혼론
플라톤은 인간의 각종 비-신체적 기능을 영혼(psyche)으로 통합했다. 플라톤 이전(주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는 여러 비-신체적 기능이 제시됐다. 신체를 떠나면 생명을 잃는 숨(psyche), 계산하는 능력(noos), 분노하는 마음(tymos), (다소 혼란스럽게 사용됐지만) 욕망하는 마음(menos), 호흡을 가능케 하는 횡격막(phrenes), 피를 순환하게 하는 심장(ker) 등이 그 예다. 더불어, 플라톤 이전 시대에는 인간의 정체성인 자아를 신체에 두는 경향이 있었다.
플라톤은 영혼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영혼 삼분설’을 제시하며 번잡하게 쓰이던 여러 개념들을 통합했고, 자아는 곧 영혼이며 신체는 영혼의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영혼 삼분설은 영혼은 계산하는 부분과 분노하는 부분, 욕구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인데, 각각의 부분은 플라톤 이전의 계산하는 능력(noos)과 분노하는 마음(tymos) 등을 나름의 방식으로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능들 중에서 플라톤은 특히 영혼의 사유기능(계산하는 부분)을 우선했다. 이러한 입장은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후대 철학자들이 사유실체로서 영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나아가 영혼 삼분설은 인간의 내적 갈등을 영혼의 각 부분들이 조화를 잃고 갈등하는 상태라는 식으로 훌륭하게 설명한 모델이 됐다.
플라톤의 영혼 삼분설은 궁극적으로 윤리학과 연결된다. 영혼 삼분설의 탄생 배경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좋은 삶은 영혼의 조화이고, 그 조화는 영혼의 각 부분이 제 기능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상태라는 논리적 흐름이다. 이러한 생각은,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두고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영혼을 “충분히 정화”하기 위해 “훌륭함(arete)과 지혜(phronesis)에 관여하도록 진력해야만” 한다(114c)고 주장한 부분에 잘 나타난다. 플라톤에 따르면, 영혼의 세 부분 중 한 부분이 주된 지위를 갖고 나머지 두 부분이 주된 부분을 위해 지원하는 구조를 형성할 때, 영혼은 조화롭다. 특히 생각하는 부분이 주된 지위를 차지할 때, 진정으로 좋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영혼의 다른 부분이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플라톤의 윤리학을 완성하는 것은 영혼 불멸설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행복한 삶은 좋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아는 능력, 다시 말해 지혜를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좋고 나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플라톤에 따르면 좋음의 불변하는 개념인 좋음의 이데아를 알아야 한다. 쉬지 않고 변화하는 자연현상과 달리 좋음의 이데아는 불변하고, 불변하는 것은 생성과 소멸도 없으므로 영원하다. 오직 영원한 것만이 영원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정체성인 영혼은 신체와 달리 불멸성을 가져야 논리적 정합성을 얻을 수 있다.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은 <파이돈>, <국가>, <튀마이오스> 등 다양한 저작에 다양하게(때로는 상호모순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개개의 논의를 설명하는 것은 이 글에서 불필요하다.

제12장 플라톤의 인식론
플라톤 이전 시대는 시 짓는(poiesis) 시인들의 권위적 지식과 기술(techne)을 가진 장인들의 지엽적 지식으로 인해 무지의 무지에 휩싸인 시기였다. 플라톤은 죽음을 앞둔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이렇게 주장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megiston agathon)이기도 한 것은 … 훌륭한 상태(덕, arete)에 관해서 … 제가 대화를 하며 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캐물어 들어가는 중에 여러분께서 듣게 되시는 것들에 관해서 날마다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캐묻지(exetasis) 않은 삶은 사람에게는 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 이것들은 제가 주장하는 그대로입니다…” (<변론> 38a). 캐묻는 삶은 ‘내가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무지의 지’를 추구하는 삶이다. (<변론> 22e 참조) 스스로를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이런 사람만이 행복에 이를 수 있다. 플라톤의 인식론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에서 출발해 윤리학과 깊은 연관을 맺는다.
플라톤에게 앎(episteme)은 진정한 덕(arete)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지성의 눈(noiesis)을 갖는 일이다. 진정한 덕은 개별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것을 그것으로 있도록 하는 보편적인 실재이다. 보편적 실재를 찾는 과정은 지식의 주입과 같이 직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나 논박(엘렝코스, elenchos)의 문답법(dialetike)으로 이루어진다. 상대의 주장을 논파하는 논쟁(existike)과 달리, 논박은 문답을 통해 상대를 난관(aporia)으로 몰아 무지를 폭로하고 무지의 지를 유도하여 상대방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엘렝코스는 영혼의 객관적 인식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나아가, 플라톤은 사람들이 홀로 문답하며 스스로의 영혼을 돌보는 태도를 갖기를 기대한다. 소피스트와 같은 상대주의자들은 ‘배우는 자의 역설(learner’s paradox)’로 문답법을 통한 앎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질문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고, 이미 알고 있다면 질문할 필요가 없으므로 무지와 지의 경계는 의미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상기론(anamnesis)을 통해 무지의 상태를 다시 정의함으로써 상대주의를 극복한다. 영혼이 불멸함에 따라 인간은 여러 번 다시 태어나고 전에 알던 것을 상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무지는 백지상태와 같은 것이 아니고, 임신한 것과 같이 지식의 잠재성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무지의 지를 얻는 순간 인간은 탐구 동기를 얻고,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이 내재한 지식을 다시 포착함(analambanein)으로써 앎을 얻는다.
플라톤에 따르면, 앎(episteme)은 언제나 필연적으로 진리를 취하는 것으로 원인의 추론(aitias logismos)에 따라 선택했기 때문에 결코 틀리지 않는다. 앎은 우연히 맞춘 옳은 판단(orthe doxa)과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감각적 지각(aisthesis)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감각적 지각을 우선시하는 소피스트의 상대주의는 논파된다. 앎의 대상은 감각으로 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성(noesis)으로 보는 가지적인 것(noeton)으로서, ‘본질 내지 존재'(ousia) 또는 ‘형상'(eidos), ‘이데아'(idea)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다. 잠재적 무지상태인 인간이 어떤 구체적 방법을 통해 이데아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문제이다. 첫째 방법은 추론(logos)을 통한 앎으로서, 진리임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정(hypothesis)을 바탕으로 문답을 진행하여 점차 가정이 필요없는 원리(arche)로 나아가는 차선적 방법이다. 둘째 방법은 직관적 앎으로서 모음(synagoge; 유개념, genus)과 나눔(diairesis; 종차, differentia)을 통해 형상(idea)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 제국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주체와 객체를 엄격히 구분한 서구 근대철학이었다. 나와 너, 중심과 변두리,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태도는 결국 일등시민과 이등시민을 구분하는 태도를 낳았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일보다 일등시민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을 더욱 옹호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근대 제국주의의 산물인 식민지였다. 이런 관점은 플라톤을 근대주의의 씨앗으로 해석할 여지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주관과 객관을 분리하는 최초의 시도는 플라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근대주의의 극단화된 시각인 우생학적 입장도 플라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 459a 참고)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근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플라톤에게도 정확히 같은 논리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일까? 모든 철학적 논의는 과거로부터 시작된 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적 생각의 단초를 제공한 최초의 철학자는 누가 있을까? 인간척도설과 같이 상대주의를 주장한 소피스트들일까? 그렇다면 결국 2000여 년 전 시작된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를 앞세운 플라톤)의 논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